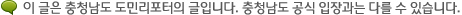
부여읍에서 서쪽으로 구룡면을 지나 외산면으로 들어서면 산은 점점 높아지고 산세도 수려해진다. 이는 차령산맥이 부여 서북쪽으로 뻗어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향해 내달리던 차령산맥이 차마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보령과 부여를 경계로 멈춰선 것이다. 바로 그곳에 언뜻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커다란 산이 솟아 길을 가로막아 선다. 미인의 눈썹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아미산이다.

▲ 아미산 아래에 옜담마을 반교마을이 펼쳐져 있다.
5일, 아미산의 동쪽 산기슭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 있다하여 들어가 보았다. 부여 외산면에 위치한 반교마을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옛 담으로 등록된 문화재마을이다. 마을 뒤로는 아미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마을 앞으로 조그만 반교천이 졸졸 흐르고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원래 널판으로 다리를 만들었다하여 처음에 판교라 불렀으나 지금은 반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반교천을 건너자, 오른편에 잘 지어진 현대식 건물과 넓은 잔디 광장이 나타난다. 마을 입구에 생각과 달리 뜻밖의 현대건물과 잔디광장이 있다 보니 혹시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하여 당황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원래 초등학교였던 이곳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자연과 친숙해지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새롭게 쉼터공간으로 만든 곳이라 한다. 누구나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인 자연유스호스텔이다.
다리를 건너 마을입구로 들어섰다. 마을길답지 않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마을로 안내를 한다. 돌담은 마을길을 따라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이어진다. 마을 전체가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 앞 텃밭까지도 돌담으로 되어 있다. 그 돌담너머로 오래된 옛집들의 지붕만 살짝 고개를 들고 낯선 방문객을 맞이한다.

▲ 돌담길이 양쪽으로 늘어서 안내를 한다
돌담은 막돌(호박돌이라고도 함)을 주워 다가 건성건성 쌓은 것 같으나 제법 견고해 보인다. 돌담의 두께도 아래는 90cm 위는 60cm정도로 두껍지만 큰 돌과 작은 돌을 공간에 맞게 짝을 맞추어 쌓아 전혀 허술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긴 돌담을 쌓게 되었을까? 돌의 생김새로 보아 다른 곳에서 가져올 만한 모양과 특징도 없다.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다가 쌓은 것이 틀림없다.
궁금하던 차에 마을을 지나던 어르신에게 여쭈어 보았다.
그 어르신은 귀가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설명을 해 주셨다.
“이 많은 돌담이 어떻게 만들어 진 건가요?”
“여기가 원래 돌밭이었어!”
“집터를 다지면서 돌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담을 만들었던 거지“
“그렇게 돌이 많았나요?”
“저 뒤 산 이름이 아미산인디 전부가 돌산이여 ”
“돌이 월마나 많았으면 도팍골이라고 불렀것어 ”
돌이 많은 이곳에 처음 들어와 집을 짓고 밭을 일군 사람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논, 밭 한 평이 아쉬웠던 당시에 어쩌면 기회의 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돌을 보물인양 인내와 희망의 끈을 가지고 열심히 돌을 캐어 돌담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 마을안 돌담길 모습

▲ 마을안 텃밭에서 어르신들이 마늘을 캐고 있다
그렇게 만든 돌담이 오늘날에는 등록문화재 280호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옛담 마을이 되었다. 더욱이 베스트셀러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작가이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이곳에 “휴휴당((休休堂)”이라는 집을 짓고 살고 있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휴휴당은 “편히 쉬어 가는 곳”이라는 뜻이다
마을 어르신 이야기로는 조선시대 때 나주정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는데,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끝없이 나오는 돌로 돌담을 쌓고 큰 마을을 형성하기 까지 많은 애환이 있었을 것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끝없이 이어지는 돌담에서 마을사람들의 마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느껴진다.

▲ 돌담이 보기보다 견고하게 싸여 있다

▲ 반교마을 감자밭에 감자꽃이 예쁘게 피었다.
돌담은 양반집 담처럼 높지는 않지만, 어른 어깨 높이(150cm)정도로 마을 전체의 집 담을 쌓은 것으로 보아 얼마나 돌이 많았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돌담을 왜 어깨 높이로만 쌓았을까? 담이 높지 않으니 마을길을 지나면서 집안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그것은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 보다는 언제나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돌담을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였다면 어떠했을까? 많이 답답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서로 잘 알지 못해 도시처럼 삭막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돌이 많아 더 높이 쌓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마을사람들이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며 소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흉금을 터놓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마을안 돌담길

▲ 밭둑에도 돌담이 쌓여 있다
당시에는 외부로 부터 침입자가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담은 소유를 의미하는 경계의 의미도 있지만 돌이 많아 돌담을 쌓게 된 이곳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터득했을 것이다.
결국 돌은 집터를 고르고 밭을 일구는데 큰 장애물이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살아 갈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데 돌담이라는 멋진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셈이다. 오늘날 옛 담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까닭도 이런 멋진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 듣기 위해 찾아오지 않나 싶다.
마을 앞산에 올라 반교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마을이 시원스럽게 한눈에 들어온다. 아미산은 마치 마을을 품에 안은 듯 어머니 같고, 마을은 잠든 아이 얼굴처럼 평화스럽다. 돌담을 따라 눈으로 마을을 다시 걸어 본다. 산바람도 시샘하듯 따라와 동행해준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돌담길에는 수많은 꽃들이 아직도 수줍게 웃고 있다. 마늘밭도 감자밭도 마을 주인인양 말동무가 돼 준다.

▲ 마을사람들이 마을길을 걸으며 정담을 나누고 있다
오랜 옛 이야기를 간직한 반교마을, 그 돌담길은 오래 걸어도 지루하지 않고 고향 길처럼 마냥 정겹고 푸근하다. 또한 이 길은 삶이 팍팍한 오늘날 한 템포 쉬어 갈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고샅길이 아닌가 싶다. 반교마을이 잘 보존되고 가꾸어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옛 담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보는 즐거움을 얻기를 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