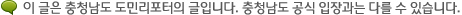오래전 책을 보다가 어느 시인이 써 놓은 시가 너무 예뻐서 노트에 끄적거려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다지요 언제나 그랬다지요
보름달 설렁설렁 잔별들 속닥속닥
낡은 흙담에 걸려있는 달빛 한 줄기
하늘을 흔들어 깨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풀벌레 그렁한 숨소리 산등성 넘어가며
한동안 복작거리다 발걸음도 뜸해지는 길
얼마나 화려한 불꽃 터뜨리려 그러는지
할미꽃 애기똥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빛바랜 가로등불만 딸깍딸깍 졸고 있는 밤
그래요 그랬다지요 언제나 그랬다지요
보름달 설렁설렁 잔별들 속닥속닥
낡은 흙담에 깨어있는 수국 하나
이 시, 예쁘지요?
엊그제 시댁에 간 길에 가까이 사시는 시고모님 댁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흙담집이 적잖게 남아 있었습니다.

▲ 아직 남아있는 농촌의 흙담과 근처 텃밭의 도라지 꽃
사람은 살지 않아도 허물어 버리지 않은 흙담집을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래전에 살던 농가들은 집 바러 옆에 텃밭을 가꾸곤 했습니다. 남새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서 상추도 키우고 아욱과 열무도 키워 뜯어 먹었습니다. 여름에는 옥수수도 한 자리 차지했더랬죠.
시간이 흘러 밭과 골목길의 경계 역할을 해 주던 흙담을 굳이 헐지 않아서 남아있게 된 모양입니다.

▲ 흙담 위의 애호박

▲ 호박이 잘 자라도록 나뭇가지를 잘라 얹어 놓은게 보입니다.
흙담 위에는 호박 덩쿨이 늘어서 있고 동그랗게 열린 호박이 된장국을 떠올립니다. ㅎㅎ
시를 음미하는 동안 제가 마치 농촌의 추억속 흙담길을 걸으며 하늘더 보고 땅도 보고, 일부러 큰 한숨 들이쉬며 다시 길가 풀밭도 보고.
또 그러다가 흙담 거너 슬레이트 지붕 너머에서 자라고 있는 호박덩쿨도 보고... 저는 마치 열네살 소녀처럼 깡총깡총 뛰며 달려 갑니다.

▲ 저기 흙담 밑 콘크리트 바닥에는 뭔가를 말리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유용함도 있긴 합니다.
우리 어릴적, 늘 그랬습니다. 그땐 모두 흙담집, 돌답집이었습니다.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지금의 콘크리트 벽돌집은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소박한 정물화 같은 느낌, 안온한 여유와 마음의 풍요를 주고, 어느 것 하나 바쁜데 없는 느긋함을 선사해 주던 흙담의 추억, 그게 우리네가 자라던 열네살때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어릴적 집 뒤의 대나무 숲길을 좋아했습다. 혼자 집을 나와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 앉아 있기도 하고, 대숲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대나무에 누워있다 보면 대숲을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새들이 주변에 찾아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 흙담과 콘크리트 담의 공존

▲ 정겨운 흙담
제가 콧노래를 부르며 대숲으로 가는 길은 주변이 온통 흙담집이었습니다. 황토흙에 짚을 잘라 섞어서 만든 흙담, 커다란 참외 크기의 돌을 섞어 쌓아 올린 흙담, 아예 황토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은 집까지. 마을은 온통 흙담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가까이 있던 흙담이었는데 70년대 들어 새마을 운동과 농촌 개량사업으로 마을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모래와 시멘트로 섞어 만든 벽돌담이 마을 골목골목을 메웠습니다. 그때는 그런게 아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생활의 편이람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아주 오랜 새월이 흘러 지금은 흙벽돌 구경할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거라면 80년대와 90년대쯤에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난 집들중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폐농가에 조금씩 남아 있을뿐입니다
페농가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지 도 허물어져 쓸쓸한 잔상을 줍니다. 농촌의 또 다른 변화를 실감케 해서 고향에 갈때마다 마은 한켠이 아릿합니다.
지금 고향에 갈때마다 늘 보는 벽돌과 콘크리트는 항상 절제된 느낌, 단호한 느낌에 무언가 엄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억누릅니다.

▲ 흙담에 세들어 사는 벌

▲ 흙담과 슬레이트 지붕과 아궁이

▲ 흙담집 안에서 키우는 닭장속의 닭
그러나 내거 어릴적 보았던 흙담은 그와 정 반대였습니다. 포근하고 정겨웠고 소박했습니다.
흙담의 구멍을 찾아 그곳을 터전 삼아 사는 이름 모를 벌이 늘 있었고, 벌레도 많았습니다. 인간과 곤충의 공존이었죠. 사람들이 쌓은 흙담에 세 들어 살던 그 많은 곤충과 벌레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농촌을 다니다 보면 전원주택 시공, 농가주택 개량.시골집 수리하기, 별장 같은 전원주택, 통나무 주택,세컨드 주택, 목조주택,주말주택, 황토 하우스 이런 푸랑카드 자주 봅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옛날의 흙담을 따올려 보곤 합니다.
이런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두 제가 생각하는 흙담이 그리운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