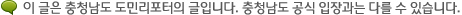“너, 현도 이민간 거 아냐?”
“현도가 이민을 갔다구? 걔 여동생이 예전에 호주 산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나이에 설마 호주를 간 건 아니...지?”
“아녀. 맞어. 호주 갔대. 그놈이”
친구의 전화. 반갑잖은 소식이었다. 한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지만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말도 없이 홀연히 떠나버린 친구. 그렇게 아무런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야 있었겠지만 우선 당장 친구 한놈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니 여간 착잡한 게 아니었다.
이놈을 언제 또 다시 볼꼬...
아쉬워 하던 차에 연락을 해 준 친구가 주소 하나를 알려줬다. 꼬부랑 글씨로 된 호주 주소였다. 편지 하란다.
‘짜~식. 그래도 양심은 있네. 친구들 잊지 못해 연락처는 주고 간 거란 말이지?’
그나마 고맙고 다행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 했다.
워낙 먼 거리로 달아났으니 소중했던 친구를 영영 못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나마 사라졌다.
그리고 친구가 전한 ‘편지 하란다’는 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정겨운 말이었다.

▲ 우체통을 보면 정감이 넘친다
‘편지’
이 얼마나 애틋하고 가슴 아련한 단어인가. 요즘같은 첨단 디지털 스마트폰 시대에 손글씨 편지라니.
컴퓨터 열어 메일 주소 창 확인하고 거기에 투닥투닥 몇글자 적어 엔터 때리면 그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내가 하고픈 말에 사진까지 동봉되어 후다닥 날아가는데 채 1분도 안걸리는 시대에 살면서 편지 하란다.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써서...
‘그래, 고맙다. 참 너 답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세대의 편지가 그거였다. 호주로 떠나기 전에도 유난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메일 같은 것과 친하지(?) 않은 채 막걸리나 좋아하고 시인처럼 살았던 친구. 그러니 멀리 가면서도 이메일이 아닌 손글씨로 편지를 하라는 주소를 남긴 것이다.
그 때 그 시절 편지에는 참 종류도 많았고 무슨 사연도 그리 다양했던지.
진정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 날리던 때가 있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어디서든 휘딱 문자 찍어 날리는 것과는 상상이 안되는 일이거늘,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손으로 글씨를 쓴 편지 이야기를 하면 “웬, 갑오경장 시절의 전설?”이냐는 반문이 돌아오기 십상이다.
당시엔 그저 관심조차 두지 않은채 어느 어느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거나 낡은 종이 궤짝 어딘가에 쑤셔박아 놨을 법한 그 많은 편지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세대에게는 질박하면서도 인생의 향기가 폴폴 날리는 중요한 삶의 아이콘이었다.
어떤 친구는 그 옛날에 주고 받았던 수많은 편지와 연서들이 아까워서 결혼 후에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싸 들고 다녔는데 어느날 우연히 그것을 본 아내가 이게 웬거냐며 하나씩 찬찬히 꺼내어 읽다가 그만 부부싸움으로 진화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전해 주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디지털화 하고 기계화 되고 획일화 되어 마치 거대한 기계가 일상처럼 찍어 내는 국화빵의 빵틀에서 사는 듯한 요즘, 그래서 이 손으로 쓴 편지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진다.
지금이야 연애 편지는 고사하고 연말연시나 개인의 애경사, 혹은 누군가의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까지 죄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세상이니 그럴수밖에.
“아버님 전 상서”로 시작하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멀리 읍내로 나와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께 드렸던 유일한 연락수단이 편지였다. 아버님 또한 “각설하고”로 시작하는 몇문자 적어 보내시며 “항상 바르게 살거라. 사군이충이며 효행이 만사의 기본이다.”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다.
“최전방에서 북괴 괴뢰군을 막아 내느라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아저씨께”로 시작하는 상투적인 위문편지도 그때 일이고, 지금도 기억만 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 오르는 낯선 싯귀를 갖다 붙여 쓴 연애편지를 부칠까 말까 1주일동안 고민하던 것도 그때 일이다.
그러니 편지를 쓰는 동안 오래된 추억을 끄집어 내는 즐거움이야 상상 이상의 그 무엇이며, 방학때 친구들에게도 쓰고,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때도 편지와 성탄 카드와 연하장을 썼다.
그래도 가장 환희에 찼던 편지는 대학에 붙었을때 벅찬 기쁨을 주변에 알린 뒤 그로부터 받은 수많은 축하 편지였던거 같다. 물론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옛 사랑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묻어둔 슬픔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곧 시간이 나면 호주에 있는 이 친구놈에게 나도 편지를 한 장 써 보련다. 덕분에 나도 참으로 오랜만에 손 글씨로 벗과의 우정을 떠 올리며 “친구여, 잘 살아 계신가”로 시작하는 글발을 한번 날려 보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