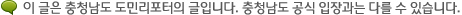
“이게 별거 아녀 뵈도 잘 말려서 놔두면 넌출넌출 우거지가 되능겨. 국 끓여 먹을때 넣어봐. 우거지국이 맛어징께. 고등어 넣고 쫄여도 짭쪼롬허니 맛있지. 저기 말려 놓은거 있응께 늬네집도 가져가거라”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서산에서 농사지으며 사실 때 항상 배춧잎을 다듬으시면서 겉의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다듬어 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생하다.
며칠전 마트 옆을 지나다 보니 배추를 잔뜩 싣고 온 트럭이 마트 안에 진열하기 위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트 창고 앞에는 배추 겉잎을 뜯어내 버린 잔 이파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잠시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그걸 커다란 봉지에 쓸어 담았다. 물론 전부다 버리기 위해 마구 퍼 담는 중이었다. 약간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머니가 푸르른 겉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않던 그 시절도 생각나서 한동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넌출넌출... 넌출넌출....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잎 속에서 뇌까려져서 결국 퇴근길에 마트에 들어가 시퍼런 배추를 사다가 아내더러 겉의 싱싱한 잎만 따내 며칠을 말리라고 한뒤 그걸로 우거지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먹었다.
아이들과 함께 우거지국을 먹으며 문득 70년대에 중학교 다닐 때 우거지국에 얽힌 담임 선생님 얘기가 생각났다.
내가 살던 충남 공주군(당시에는 市로 승격되기전 郡이었음) 우성면 보흥리 시골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멀리 공주 읍내로 나가 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배움의 길을 걷기 위한 머나먼 유학길이었다.
농촌에서 돈이 많은게 아니니 공주 읍내로 나가 학교를 다닌 학생들 모두 하숙은 언감생심이고, 전부다 손바닥만한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했다.
나이 겨우 14살 먹은 사내아이들이 자취를 했으니 얼만 변변치 못했겠는가. 전기밥솥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 연탄불 피워놓고 거기에 냄비올려 밥을 지어먹던 시절이었다. 반찬이래야 고향에서 가져온 김치와 멸치, 깻잎 장아찌 등이 전부.
나는 그나마 당시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형과 함께 생활했으니 좀 나은 편에 속했다.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은 항상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다. 어떤때는 말 안듣는 제자, 어떤때는 공부 잘하는 제자, 또 어떤때는 뭔가 잘해서 상받은 제자들을 태우고 집에다 바래다 주시곤 했다. 그 자전거 한번도 못 타본 아이들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할만큼 열성적이셨다.
그런데 선생님은 자전거에 조그만 장바구니를 하나 매달아 아침 운동을 다니시다 길가에 버려진 무나 배추 잎 중 쓸 만한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시곤 했다. 이것을 말려서 우거지국을 끓여 드시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아침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우리 자취방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셨다. 우산도 없으셨는지 머리와 얼굴, 온몸이 비에 젖으셨다.
선생님은 손에 든 검은 비닐 봉지 하나를 방바닥에 놓으시고는 냄비를 가져 오라고 하셨다. 그 봉지에는 우거지가 한 가득 들어있었고 다른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 말아 싼 뭔가가 있었다.
“늬덜, 시골에서 가져온 고추장 있지? 그거 하고 냄비좀 가져와 봐라”
선생님의 말씀에 형과 나는 영문도 모른채 손바닥만한 부엌에 가서 고추장 단지를 갖어왔다. 그러자 선생님은 지체없이 냄비에 우거지를 넣은 뒤 물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 넣었다. 먹으려고 놔두었던 멸치볶음음도 거기에 넣은 뒤 대충 간을 하시고는 신문지에 싼걸 풀어 꺼내셨다. 선생님이 둘둘 말아 싸셨던 신문지 안에는 잘 다듬어져 토막이 난 고등어 두 마리가 들어있었다.
선생님은 거기에 적당히 물을 부으신뒤 나더러 그걸 푹 끓이라고 하시는게 아닌가.
그제서야 그게 즉석식 고등어 우거지 조림이란걸 알았다. 그야말로 담임선생님표 고등어조림인 것이다. 어린 제자가 어렵사리 자취를 한다는걸 아시고는 직접 고등어와 우거지를 구해서 자취방을 습격(?)하신 것이다.
부엌에 피워 놓은 연탄불 위에서 고등어 우거지 조림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형과 나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냄비 뚜껑에 구멍이 뚫어지도록 쳐다 보았다.
선생님은 적당히 시간이 지나자 “불이 세면 음식이 타니까 이젠 좀 줄이거라”하시며 요리법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지났을까. 뱃속의 거지가 깡통 두드리는 소리를 몇곡이나 연주했을까 싶을 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자 선생님은 “늬덜, 나한테 밥 한공기 줄 쌀은 있냐?”시며 농을 걸어 주셨다.
형과 나는 “헤헤. 그럼유”라며 밥을 펐다. 워낙 가난해서 상도 없이 지낸터라 밥 먹을때는 늘 방바닥에 신문지를 펼치고 먹었는데 그날도 조그만 자취방 바닥에 널따랗게 신문지를 폈다.
이미 방안 가득 밴 고등어 우거지 조림 냄새. 밖에선 빗줄기가 주룩주룩 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 형제는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제자 사랑 담긴 고등어 우거지 조림을 정말 둘이 먹다가 한명이 죽어도 모를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늬덜, 끼니는 항상 잘 챙겨먹지? 귀찮다고 밥 걸르믄 안되능겨. 한참 클때니까”
제자가 행여 밥이라도 굶고 다닐까봐 걱정스러워 말씀하신 당부셨다.
지금도 길을 걷다가 길가나 다른 집 대문 안에서 주부들이 배추나 무우 잎을 다듬는걸 보면 그때의 우거지 고등어 조림이 떠오른다.
선생님의 제자 사랑 덕분에 우리 형제 역시 바른 길로 장성할수 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